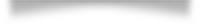여기 조상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전 감신대교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자들이 있기에 추도예배 장례예배가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
“조상제사와 하느님 예배는 둘이 아니다”
행동하는 신학자 이정배 전 감신대 교수 ‘제사와 예배’ 특강
이정배 전 감리교신학대 교수는 1986년부터 30년 동안 대학에서 종교철학을 가르쳐 왔다. 그는 다원주의 세계관을 가졌던 스승 변선환(1927~1995) 교수의 가르침을 받아 세상을 넓은 눈으로 바라봤으며, 불교의 이기영 교수, 유교의 유승국 교수, 민중신학자 안병무 교수, 개신교 강원용 목사, 가톨릭의 심상태 신부 등과 두루 교감하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이 교수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열린 한국종교발전포럼(회장 박재갑)에서 ‘제사와 예배’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기존의 기독교와 유교가 가진 제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각인시킨 그의 강연내용을 발췌 요약한다.
유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부모 뜻과 무관하게 신학을 공부하게 됐다. 아버지는 “유세차…”로 시작되는 축문을 읽을 때면 조상을 생각하며 눈물을 펑펑 흘리시던 분이었다. 그런데도 신학대에 입학한 자식을 생각해 종손이면서 제사 때 절도 안 하고 제사 모임에도 참석지 않자 형제 간의 왕래가 뚝 끊겼다. 신학대에 들어갔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제사 문제는 세월호 사고 때도 불거졌다. 세월호 참사 유족 가운데 70%가 기독교 신자였다. 이들은 제사라는 의식을 통해 자식들을 기리려 했고 먹고 싶은 음식도 주려고 했는데,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한국교회가 유족들을 못 품고 내친 것이다. 그 결과 교회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스스로 따를 수 없다고 여기게 된 것이다.
 |
| 이정배 전 감신대 교수는 “조상제사와 예배는 둘이 아니다”며 “개신교의 과제는 유교의 부정적 모습을 지우고 긍정적 모습을 활성화해야 하며, 무엇보다 제례의 예배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신교에 비해 가톨릭은 중세말기에 시작된 ‘연옥설’을 바탕으로 죽은 조상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안을 가지고 있다. 개신교는 직접 신앙을 고백하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쳐 왔는데, 가톨릭은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조상들이 믿지 않고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가르쳤던 것이다. 가톨릭은 제사를 수용하는 입장이다.
기독교는 제사가 우상숭배가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유교도 제사 때 지나친 허례허식과 미신행위는 배척해야 한다. 조상의 끝이 어디인가. 끝을 찾아 올라가면 하느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유교는 망각한 하느님을 되찾아야 하고, 기독교는 조상을 되찾아야 한다. 유교는 죽으면 혼백이 분리되는데 제사를 통해 혼백이 합쳐진다고 한다. 이때 후손들의 삶속에 기억되는 것이다.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잊혀지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 삶과 죽음은 단절이 아니다.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조상신을 능가하는 최고신의 존재를 인정했고 조상의 영령을 신적 실체로 보는 것에 반대했다. 또 죽은 사람의 위패, 즉 신주(神主)를 조상을 기억하는 일종의 상징물로 여겼을 뿐 혼령의 거주처로서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다산은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을 효의 근본으로 삼았다. 부모에 대한 살아서의 효가 죽어서의 제사였던 것이다. 다산에게 제사란 온갖 허례허식을 벗겨낸 것으로, 공자의 생각과 맥이 닿았다. 또한 제사란 자손이 계속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다산의 조상제례는 조상(신)과 하느님 관계에 대한 개신교적 입장을 정립함에 큰 도움이 된다. 유교의 제례를 최소주의에 입각해 그 본질을 회복시켰기 때문이다.
실학자 다산 정약용은 조상신을 능가하는 최고신의 존재를 인정했고 조상의 영령을 신적 실체로 보는 것에 반대했다. 또 죽은 사람의 위패, 즉 신주(神主)를 조상을 기억하는 일종의 상징물로 여겼을 뿐 혼령의 거주처로서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 다산은 부모의 뜻을 받드는 것을 효의 근본으로 삼았다. 부모에 대한 살아서의 효가 죽어서의 제사였던 것이다. 다산에게 제사란 온갖 허례허식을 벗겨낸 것으로, 공자의 생각과 맥이 닿았다. 또한 제사란 자손이 계속 부모를 공경하여 효를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다산의 조상제례는 조상(신)과 하느님 관계에 대한 개신교적 입장을 정립함에 큰 도움이 된다. 유교의 제례를 최소주의에 입각해 그 본질을 회복시켰기 때문이다.
유교는 제사의식을 최소화하고 조상과 아무런 감응 없이 의례적으로 드리는 제사는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조상의 끝이 하느님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거유 유승국은 유교가 하느님(상제)을 잃은 것을 애석해했고, 다석 유영모는 “본래 유교 역시 조상만 아는 유(有) 종교가 아니라, ‘없이 계신 하느님’을 말하는 무(無)의 종교”라고 했다. 기독교 역시 조상에 대한 효를 상실한다면 하느님을 예배할 수 없게 된다. 결론적으로 조상제사와 하느님 예배는 둘이 아니다. 제사는 ‘인간을 근원으로 이끄는 하나의 거룩한 끈’이다.
 저의 경우 제사 때 신주를 대신하는 제례의 상징물로서 밤, 대추, 감을 늘 준비했다. 밤은 근본을 기억하겠다는 표징이고, 대추는 자식을 낳아 생명을 이어가겠다는 표식이며, 감은 조상의 뜻에 따라 자식을 진정한 인격체로 교육하겠다는 다짐이다. 제사 때는 조상을 추모하는 사진과 조상이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를 간편하게 준비해 상을 차렸다. 이런 준비가 끝나면 성경책을 갖고 상 앞에 무릎 꿇고 자리해 살아생전 조상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으며, 후손들을 위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를 기억해 내려고 애썼다. 절이란 우상숭배가 아니라 모질게 살았던 조상들의 삶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작게 만드는 행위다.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제사를 폐했다. 이러한 의식 속에는 조상의 끝이 하느님이란 믿음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저의 경우 제사 때 신주를 대신하는 제례의 상징물로서 밤, 대추, 감을 늘 준비했다. 밤은 근본을 기억하겠다는 표징이고, 대추는 자식을 낳아 생명을 이어가겠다는 표식이며, 감은 조상의 뜻에 따라 자식을 진정한 인격체로 교육하겠다는 다짐이다. 제사 때는 조상을 추모하는 사진과 조상이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를 간편하게 준비해 상을 차렸다. 이런 준비가 끝나면 성경책을 갖고 상 앞에 무릎 꿇고 자리해 살아생전 조상들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으며, 후손들을 위한 그들의 삶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가를 기억해 내려고 애썼다. 절이란 우상숭배가 아니라 모질게 살았던 조상들의 삶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작게 만드는 행위다. 마지막은 주기도문으로 제사를 폐했다. 이러한 의식 속에는 조상의 끝이 하느님이란 믿음이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유교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한국에서 개신교의 과제는 유교의 부정적 모습을 지우고 긍정적 모습을 활성화하는 게 현명하다. 제례가 효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로써 하느님 안에서 조상을 이해하고 조상의 뜻을 이어가려는 절차라면, 향후 개신교는 제례의 예배화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마땅하다.
정성수 문화전문기자 [email protected]







 우리는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가?(시148:1~14)_2016-07-03
우리는 왜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가?(시148:1~14)_2016-07-03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아야 하는 이...